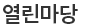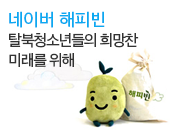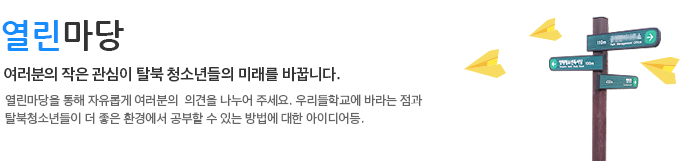공지사항


전남 고흥군 소록도 신성교회 박정자(80·여) 집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애써 참던 눈물이 번졌다. 6·25전쟁 중 연합군과 국군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소록도에 와서 보낸 근 70년이 기억의 저편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모양이다.
박 집사 이야기는 해방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평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7세 때 작은 상처가 났다. 곪는가 싶더니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보건소에 갔지만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큰 병이 들었음을 직감했다.
의사는 이리저리 진찰하더니 침대 하나 달랑 놓인 방으로 격리시켰다. 밖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격리 사흘째, 식사하러 가는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한 사람이 ‘엉엉’ 울고 있었다. “내 새끼 보러 가는데 왜 말리는 겁니까.” 엄마였다. 엄마는 또 보러 오겠다고, 마음 굳게 먹고 잘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9세. 강원도(북한) 원산 앞바다 대도로 강제 이송됐다. 대도는 당시 북한 한센인 350여명이 거주하던 섬이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됐다. 힘들고 배고픈 생활이 계속됐다. 얼마 후 평양에 사는 친오빠가 사과 한 보따리를 들고 방문했다.
오빠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눈썹이 없어”라고 말하는 오빠의 얼굴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말에 그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대도수용소 생활 3년째. 갑자기 총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났다. 한바탕 공습이 지나가고 밖에 나가 보니 감시하던 직원들이 없었다. 한센인들을 버리고 섬을 빠져나간 것이다. 곳간의 양식도 모두 가져갔다.
어른들은 하얀 이불보에다 빨간 글씨로 크게 “여기는 한센인들이 사는 곳입니다”라고 썼다. 이 글씨 덕분인지 비행기 폭격이 중단됐다. 얼마 후 유엔군과 국군이 왔다. 그들은 친절했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건넸다.
1951년 1·4후퇴 때 한센인 100명이 남한행 배를 탔다. 걸음이 늦은 11세 소녀는 마지막으로 국군 아저씨 등에 업혀 함정에 태워졌다.
그렇게 혈육과 끊어졌고 소록도 생활이 시작됐다. 23세에 소록도에서 만난 남편은 61세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함께 배를 탔던 한센인도 모두 죽었다. 혼자 남은 것이다. 특별한 역사의 산증인이 됐다.
그의 믿음은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해방 후 북한교회가 공산당의 핍박을 받을 때 엄마와 함께 참석했던 지하교회 예배.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됐다. “정자야. 사랑하는 내 딸. 네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란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거기에 네 생명이 있다”고 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믿음 가운데 살았다.
그동안 한센병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험상궂게 생겼다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지켜주셨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과거 한센인 7000여명이 둥지를 틀고 살던 소록도에는 현재 3개 마을 550여명만이 남아 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라 거동이 불편하다. 박 집사는 자신보다 더 불편한 한센인을 돌보고 있다. 기도해주고 각종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에게 오히려 기도해주며 마음의 기쁨과 안심을 선물한다.
최근 모퉁이돌선교회 대북라디오 방송 OKCN ‘또 다른 숲이 시작됐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소록도 신성교회를 건축했던 추억도 들려줬다. “처음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 얼마 뒤 우리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했지.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았지. 교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잖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기사출처 : 국민일보